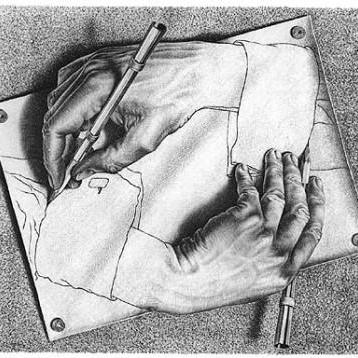[끄적이] 빨리 기술면접에서 털려보고 싶다
그동안 이력서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다. 자꾸 전공 지식이나 포트폴리오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었고, 그리고 학생과 같은 지금이 운영체제, 네트워크, 컴퓨터 구조, C++ 등 프로그래밍의 기본기를 학습하는데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. 그래서 너무 취업을 급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. 내실을 다지기 위해. 이력서를 쓰는 것 자체도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기에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는 것 같았다. (취업을 위해 공부하는건지, 공부하기 위해 취업을 하는건지 가끔 헷갈림, 아니면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인지..? 그냥 대학원을 갔어야하나)
하지만 대체 어디까지 준비해야하는지,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비로소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. 비단 프로그래머의 길만이 아니라 내 전공에서도 나보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다.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 실력이 부족해도 취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. 준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알아서 판단해줄 것이기 때문에..
포프님의 영상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강해져서 이력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기로 마음 먹었다. 이런 생각의 기초에는
- 포트폴리오의 수준, 존재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. 포트폴리오도 결국에 수단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‘난 프로그래밍을 잘 합니다’를 보일 수 있으면 충분
- 여러 채용 프로세스: 코딩테스트, 기술면접 등을 경험해볼 기회를 갖는 것
이 두 가지 생각이 지배적이었다. 제대로 된 기술면접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, 뭘 물어보는지, 어느 수준의 것들을 알아야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서 꼭 경험해보고 싶다. 설령 탈탈 털리더라도 말이다.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정확히 입밖으로 설명하는 것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난 꼭 그 경험을 빨리 해야만할 것 같았다. 상반기에 어디 붙으면 좋은거고, 설령 떨어져도 그게 하반기에 크나큰 밑거름이 될 것이기에.
혼자 강의 듣고 책 읽으며 공부하는 것 또한 공부가 되지만, 분명히 실무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크다. 실무를 하면서 아 그때 책에서 봤던 것들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배우는 것들도 아주 클 것이라고 기대한다. 그런 상호작용을 간절히 바라면서 취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본다.